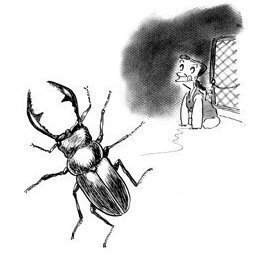땀을 뻘뻘 흘리며 아궁이에 장작 넣으랴 주걱으로 가마솥의 조청 저으랴 바쁜 와중에도 주실댁의 머릿속은 선반 위의 엿가락 셈으로 가득 찼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그저께 팔다 남은 깨엿 서른세가락을 분명 선반 위에 얹어 뒀건만 엿기름 내러 한나절 집을 비운 사이 스물다섯가락 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방에는 열한살 난 아들밖에 없고 그 아들은 앉은뱅이라서 손을 뻗쳐 봐야 겨우 문고리밖에 잡을 수 없는데 어떻게 엿가락이 축날 수 있단 말인가? 추실댁은 박복했다. 시집이라고 와 보니 초가삼간에 산비탈밭 몇마지기뿐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다 신랑이란 게 골골거리더니 추실댁 뱃속에 씨만 뿌려두고 이듬해 덜컥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장사를 치르고 이어서 유복..